신동훈의 사람, 질병, 그리고 역사
다양한 제책 기술: 폼잡는 목판
초야잠필
2025. 2. 11. 10:28
반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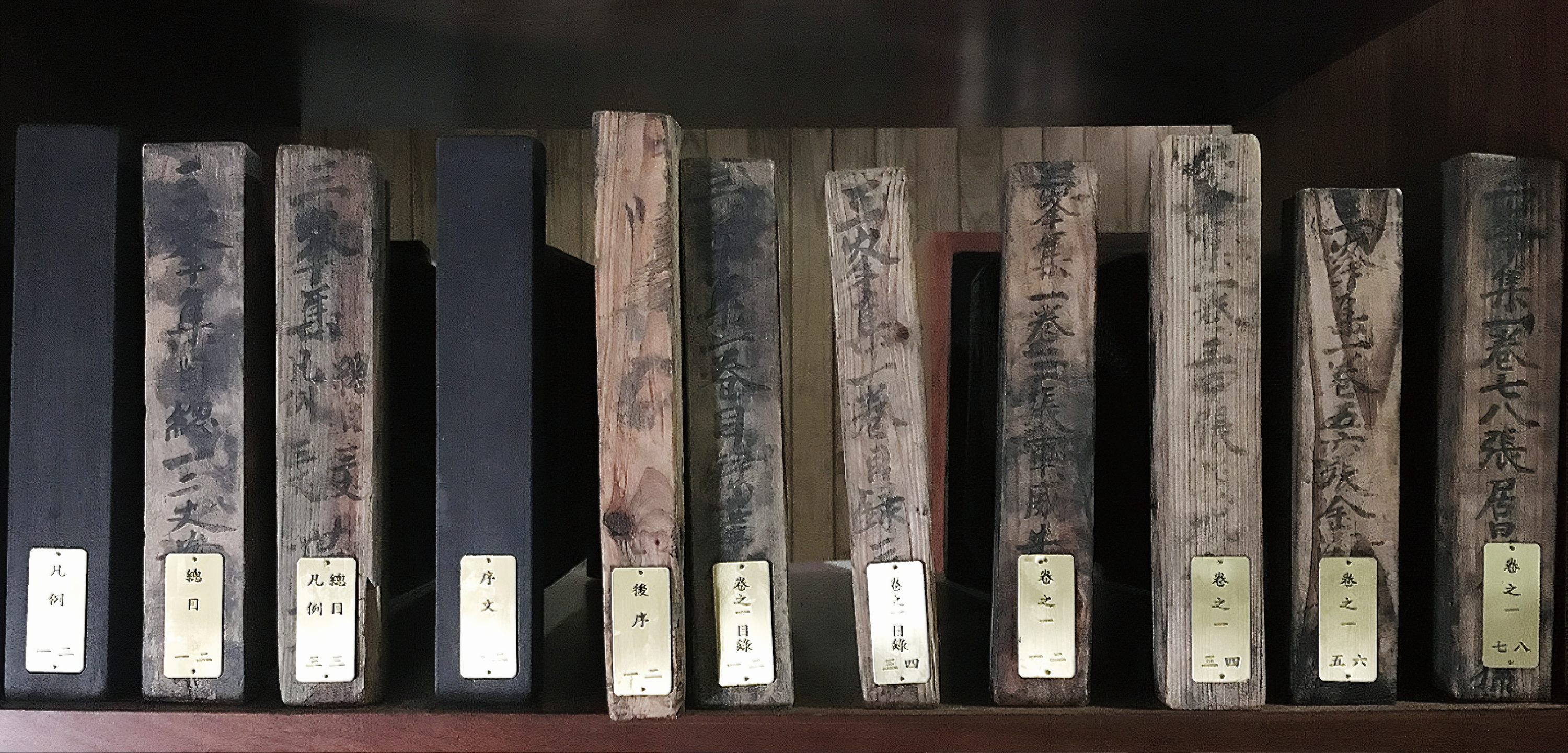
결국 이건 김 단장께서도 쓰신 내용이지만
전통시대의 우리나라 목판은 목판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도 많았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팔만대장경.
이건 필자가 보기엔 목판 각출 자체가 목적이다.
책을 만들어 찍어내는 건 그 다음 이야기고,
길이 전할 법보 목판을 만들어 내는 그 자체가 더 큰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목판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꽤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런 부분까지 더 하면,
우리가 조선시대에 필사, 활자, 목판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인쇄물을 만들기에 앞서 복사할 것인가, 인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목판 자체가 목적인가,
완벽한 교정이 목적인가,
보안이 목적인가,
소수 사람이 보는 출판물이 목적인가
되도록 많은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책의 제작이 목적인가,
아니.
여기에 하나 더 문제가 있다.
먹은 얼마나 있는가,
종이는 충분한가.
종이.
팔만대장경 목판이 앞뒤 16만 면이면
종이가 16만장이다. 다 찍어 내려면.
이 종이 가격을 생각해 보면 목판 인쇄도 그렇게 만만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었음에 틀림없다.
팔만대장정 전질을 열 부만 찍어 뿌려도
종이가 160만 장이 필요하다.
고려시대 내내 팔만대장경을 몇 부나 인쇄했을까?
필자가 팔만대장경은 각판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