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죽었다 깨나도 시스템으로 노벨상 연구자를 만들 순 없다
노벨상 수상 시즌이다. 이맘쯤이면 언제나 우리는 좌절하면서 또 언제나 우리의 눈길은 이웃집 일본으로 향하니, 2021년에도 어김없이 일본은 수상자를 냈으니 노벨물리학상 마나베 슈쿠로(眞鍋淑郞)라는 올해 아흔살 과학자가 그 주인공이니, 이르기를 그가 28명째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란다.
물론 그를 일본인이라고 규정하기엔 저어되는 측면이 있으니, 독일 과학자 클라우스 하셀만 Klaus Hasselmann (89), 이탈리아 연구자 조르조 파리시 Giorgio Parisi (73)와 함께 공동 수상자 명단에 오른 그는 국적이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다.
따라서 그의 풀네임은 마나베 슈쿠로보다는 Syukuro Manabe(真鍋淑郎)가 더 정확한 편이라 Japanese-American meteorologist이자 climatologist라 하니, 주된 전공은 기상학, 특히 기후학이다.
일본 본토산으로 도쿄대 박사 수료 후 미국으로 건너가 지구온난화 연구에 매진함으로써 그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냈다고 스웨덴한림원이 평가한 모양이라, 그의 국적이 미국이건 일본이건, 중요한 것은 그는 일본의 유산이라는 점이다.
물론 철저한 도제식 시스템을 고수하는 일본식 교육시스템이라고 무에 대단할 것이 있겠냐만 아무튼 일본 혹은 일본계 노벨상 수상자는 28명이나 낼 동안 우리가 이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라고는 다 떨어진 정치목적 팽배한 김대중 평화상 수상 꼴랑 한 건에 지나지 않는가?

더불어 노벨상이 무엇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느냐 하는 비판도 적지 않지만, 그 진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그것이 무엇을 판단하는 가늠자가 되기에는 그 역사가 깊은 만큼 충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덧붙여 노벨상은 국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개별 혹은 연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 그것으로써 국경을 연결해 그가 속한 커뮤너티, 특히 국가 state까지 연결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간단히 말해 노벨상 수상자 쪽수로 그 나라 학문의 수준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 나 역시 백퍼 동의한다.
하지만 액면이 저렇다 해서 우리를 성찰하지 아니할 수도 없다. 더 간단히 말해 이웃 일본만 해도 저리 노벨상 연구자를 쏟아내는데 대체 무엇이 한국은 그 절반은 고사하고 반의 반도, 그 발바닥 핥는 수준도 아니되는가 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질문을 간단히 치환한다. 왜 한국은 노벨상 수상 과학자가 나오지 아니하는가?
물론 내가 간여하고 교유하는 대부분 연구자가 자연과학보다는 이른바 인문과학에 국한한다는 함정 혹은 한계가 있기는 하며, 그런 까닭에 그 경험 혹은 판단을 일반화하는 위험성이 내재하기는 하지만, 그 사회 커뮤너티 문화수준은 분야를 방불하고 일정 부문 비례하기에 내 이쪽 경험을 일반화한다 해서 그닥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객설이 길었다. 왜 우리는 이 모양 이런가?
첫째, 연구실 의자에 진득이 쳐박혀 궁댕이에서 진물이 나도록, 그리고 치질 걸리도록 연구에 매진해야 할 사람 상당수가 암체어를 박차고 바깥으로 기어나가 앙가주망이 학자의 본령이니 하는 케케묵은 샤르트르시대 좌우명을 들먹이며 엉뚱한 짓들을 일삼는 까닭이다.
직업적 학문종사자는 죽어나사나 논문으로 승부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직업적 학문종사자 상당수가 논문보다는 논설에 익숙한 족속이라, 쓰라는 논문은 팽개치고 잡지며 신문, 요새는 sns에다가 신념이라는 덧칠을 씌운 싸지르기, 더 간단히 말해 제갈성렬식 고함 지르기로 직업을 삼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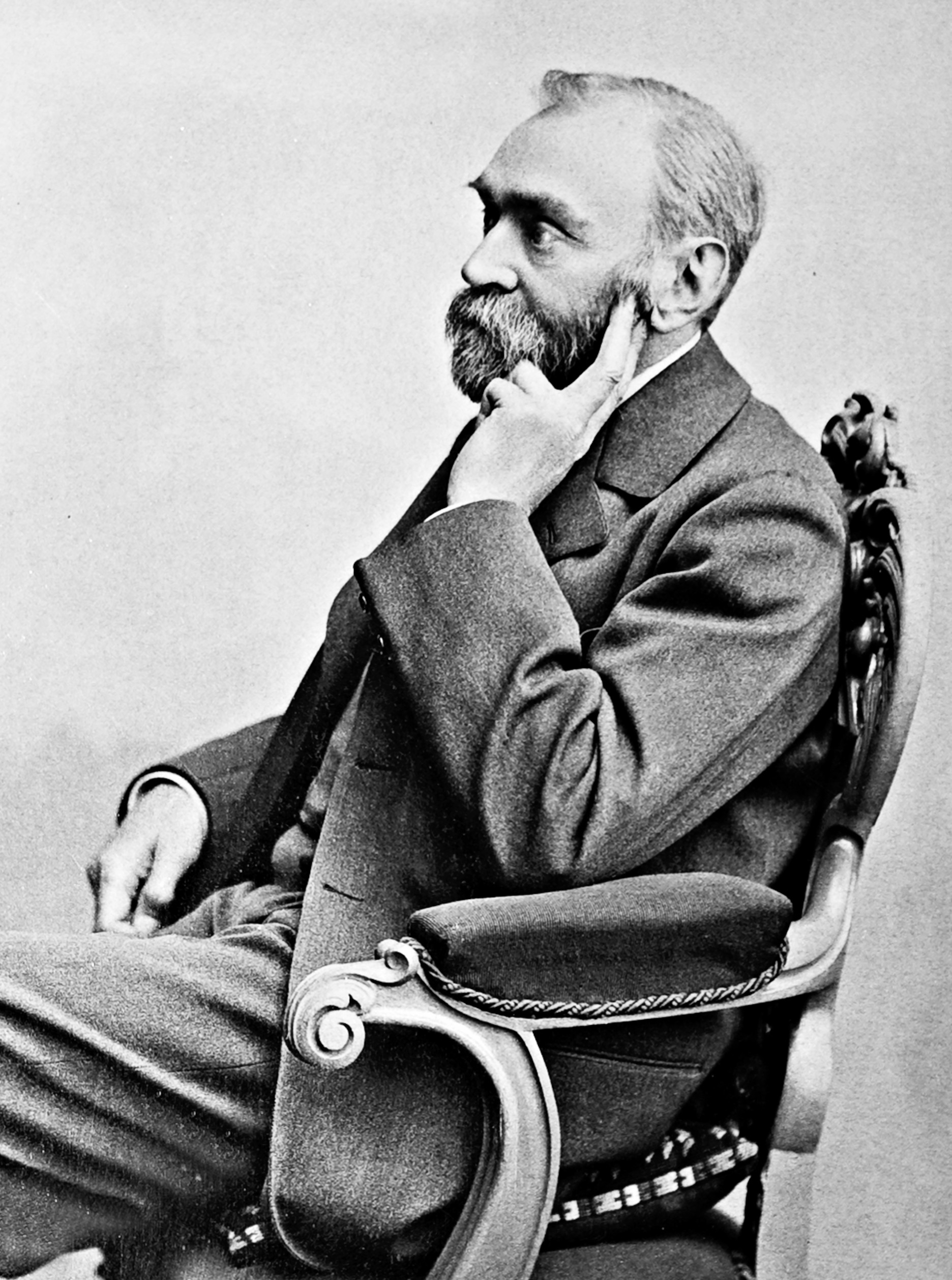
이런 싸지르기, 그리고 고함은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으레 직업적 학문종사자 본령인 전거典據를 동반하지 않는다. 왜? 전거란 증거요, 그 주장을 바탕하는 절대의 근거이어니와, 싸지르기 혹은 고함은 그 고된 과정을 생략하고는 결론만 지르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기 좋은 글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
이 단맛에 빠져 지금 이 순간에도 전거와 그것을 기반으로 삼는 논리 구성과 그에서 비롯한 결론 도출에 고심하며 머리가 빠지고 이빨이 흔들려야 할 직업적 학문종사자가 연구실 암체어 버리고는 pc 앞에, 혹은 휴대폰 들고서 싸지르기에 여념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논문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성명이 친숙하다. 논문을 쓰야 할 시간에 그건 팽개치고 정부당국을 향해 돈 달라 아우성치는 성명서 작성에 여념이 없다.
이 싸지르기는 필연적으로 다음 문제를 낳는다.
둘째, 자리를 탐하고 돈을 탐한다.
물론 사회구조, 특히 경쟁 일변도인 대학사회 구조에서 이 문제를 찾는 사람을 많이 봤다만, 다 핑계다. 나는 제대로 된 경쟁구조 시스템이 도입되지 아니해서 저 커뮤너티에 내가 말하는 문제가 빈발한다고 본다.
암체어에 진득이 박혀 연구에 매진해야 할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 언필칭 그것을 내손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하고는 모조리 어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어 공모가 뜨지 않나 해서 그쪽으로만 시선을 돌리거니와, 이를 부채질한 제도적 패착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교수 겸직 허용이다.
이 문제는 하도 여러 번 말했으니 중언부언은 피하지만, 어찌하여 교수한테만 유독 겸직이 허용된단 말인가? 조국이, 김상조가 연구자로서 뛰어나며 뛰어났는가?
저들이 싸지른 것은 샤우팅이지 철저한 전거를 동반하며 그에서 비롯한 경천동지할 새로운 사고를 일깨운 연구자는 결코 아니다. 저네들이 쓴 논문 몇 편을 본 적 있는데, 저 친구들은 프라프갠더지 스칼러가 아니다.
셋째, 그렇다면 저네들이 연구결과라며 내어놓는 논문은 볼 만한가?
저네들 논문 백편 중 99편이 발주다. 쉽게 말해 내가 진짜로 이건 쓰고야 말겠다. 이 문제는 나 아니면 지구상 단군조선 이래 어느 누구도 풀지 못한다는 철저한 사명 혹은 열정에서 나온 것은 가뭄에 나는 콩 같기만 하고, 논문 거의 대다수가 발주물이다. 무슨 프로젝트 성과물이거나 무슨 학술대회에서 강제로 할당받아 어거지로 쓴 논문이 백편 중 99편이다.
이런 논문 치고 제대로 된 글 못봤다.
나를 격발하고 계발하는 새로운 연구성과는 출발이 호기심이며, 과정은 열정이며 정점은 광인 정신이다. 미친 정신이 그런 성과를 내기 마련이다.
돈 받아, 돈 타내서 쓰는 논문, 한국연구재단에 기획서 그럴 듯하게 다듬어 집어넣고 타내는 국민세금으로 무슨 경천동지할 논문이 나오겠는가?
남들을 격발하는 사람은 언제나 아마추어다. 아마추어를 우습게 보는 사람 많으나 아마추어리즘이야말로 열정과 동의어이며, 그것이 곧 광인정신이다.
우리는 왜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가?
거창한 원인 없다. 미친 듯이 공부해야 할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하고, 나머지는 잡것들인 까닭이지 뭐가 있겠는가?
한국은 언제가는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건 순전히 요행이지 시스템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