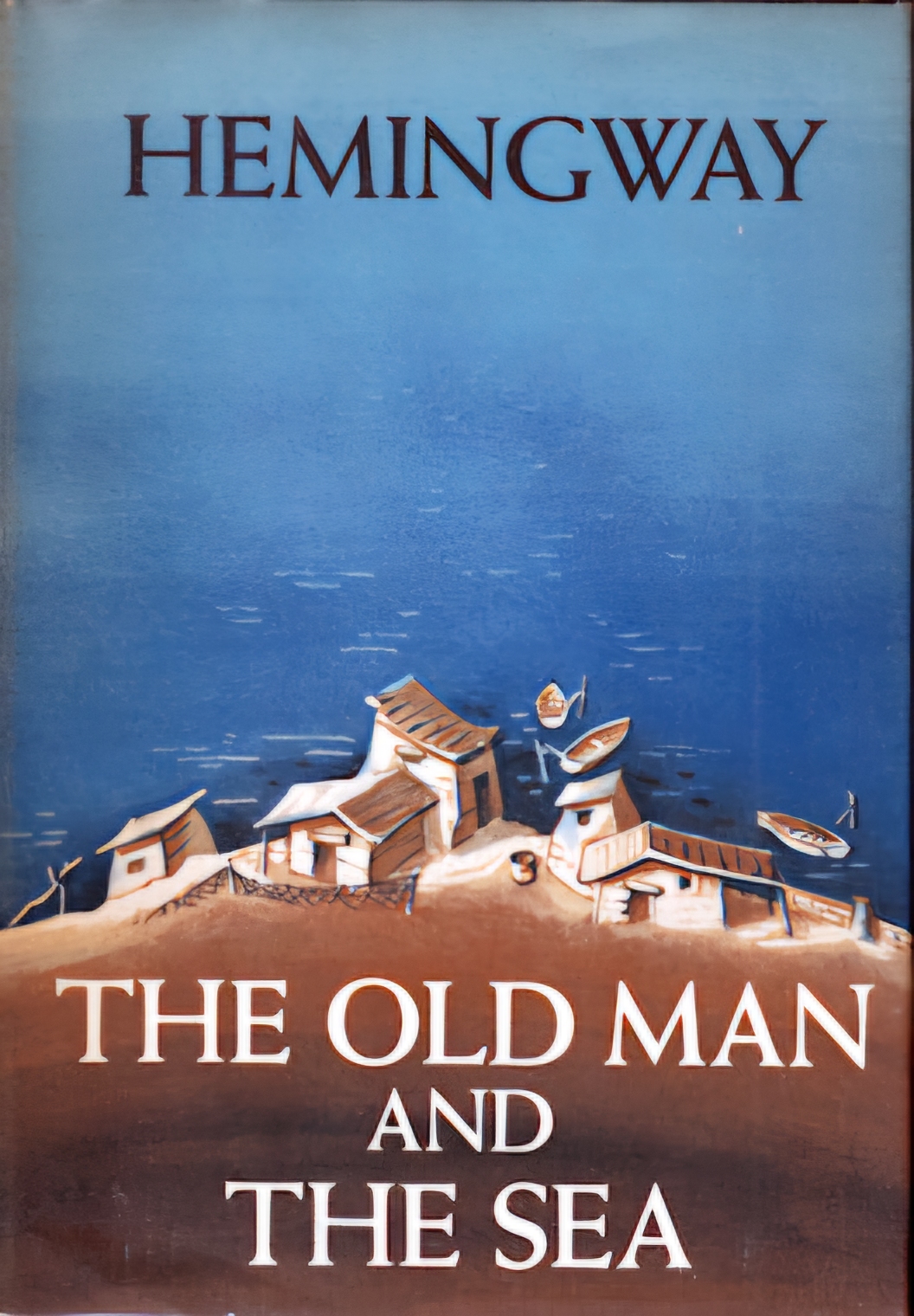
노인과 바다는 필자가 중학교 때인가 번역판을 읽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헤밍웨이라는 인물 자체가 기자 출신으로 글이 배배꼬는 것없이
단문으로 짧게 끊으며 분명히 사실을 전하는 분위기 탓에
그 시절에도 소설의 이해가 어렵지는 않았고
당시로서는 뭔가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카리브해 낚시 이야기 상황이
머리에 강렬히 남았다.
최근 노인과 바다를 다시 읽어보니
나이가 들어 읽게 되니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다.
노인의 심리에 이입이 더 쉽게 된다고나 할까.
내 나이 60에 노인과 바다의 백미는 마지막 페이지이다.
‘That afternoon there was a party of tourists at the Terrace and looking
down in the water among the empty beer cans and dead barracudas a woman
saw a great long white spine with a huge tail at the end that lifted and swung with the tide while the east wind blew a heavy steady sea outside the entrance to the harbour.
"What's that?" she asked a waiter and pointed to the long backbone of the great fish that was now just garbage waiting to go out with the tide.
"Tiburon," the waiter said, "Eshark." He was meaning to explain what had happened.
"I didn't know sharks had such handsome, beautifully formed tails."
"I didn't either," her male companion said.
Up the road, in his shack, the old man was sleeping again. He was still sleeping on his face and the boy was sitting by him watching him.
The old man was dreaming about the lions.
노인의 평생의 낚시질 경륜으로 낚아 올린 고기는
다들 아는 것처럼 돌아오는 길에 상어에 다 뜯어 먹히고 뼈만 남아 있다.
그 크기에 다들 놀란다.
온전한 고기였으면 더 대단했을 것이다.
바닷가에 버려진 고기 뼈를 보고
낚시를 잘 모르는 관광객도 보고 그 크기와 아룸다움에 놀란다.
이들은 노인이 잡아온 생선이 상어라고 생각한다.
노인은 집에서 자고 있다.
잠들면서 젊은 시절 꿈꾸었던 사자를 다시 본다.
어차피 죽을 때까지 뭔가 인생에 유종의 미를 남기고자 해도
상어가 다 뜯어 먹고 남은 것도 없을 지도 모른다.
그나마 들고온 청새치 뼈다귀도 모르는 사람들은 상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노인은 젊은 시절 꿈을 다시 꾼다.
'사람, 질병, 그리고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기가 깎는 머리 (29) | 2024.12.10 |
|---|---|
| 팔십 오일째 대어를 낚은 노인 (30) | 2024.12.09 |
| 한국사의 두 번째 키워드: 망국의 위기감 (25) | 2024.12.05 |
| 그리스와 정말 비슷한 한반도 남해안의 지리 (33) | 2024.12.03 |
| 학문에서 누가 우위에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33) | 2024.12.03 |




댓글